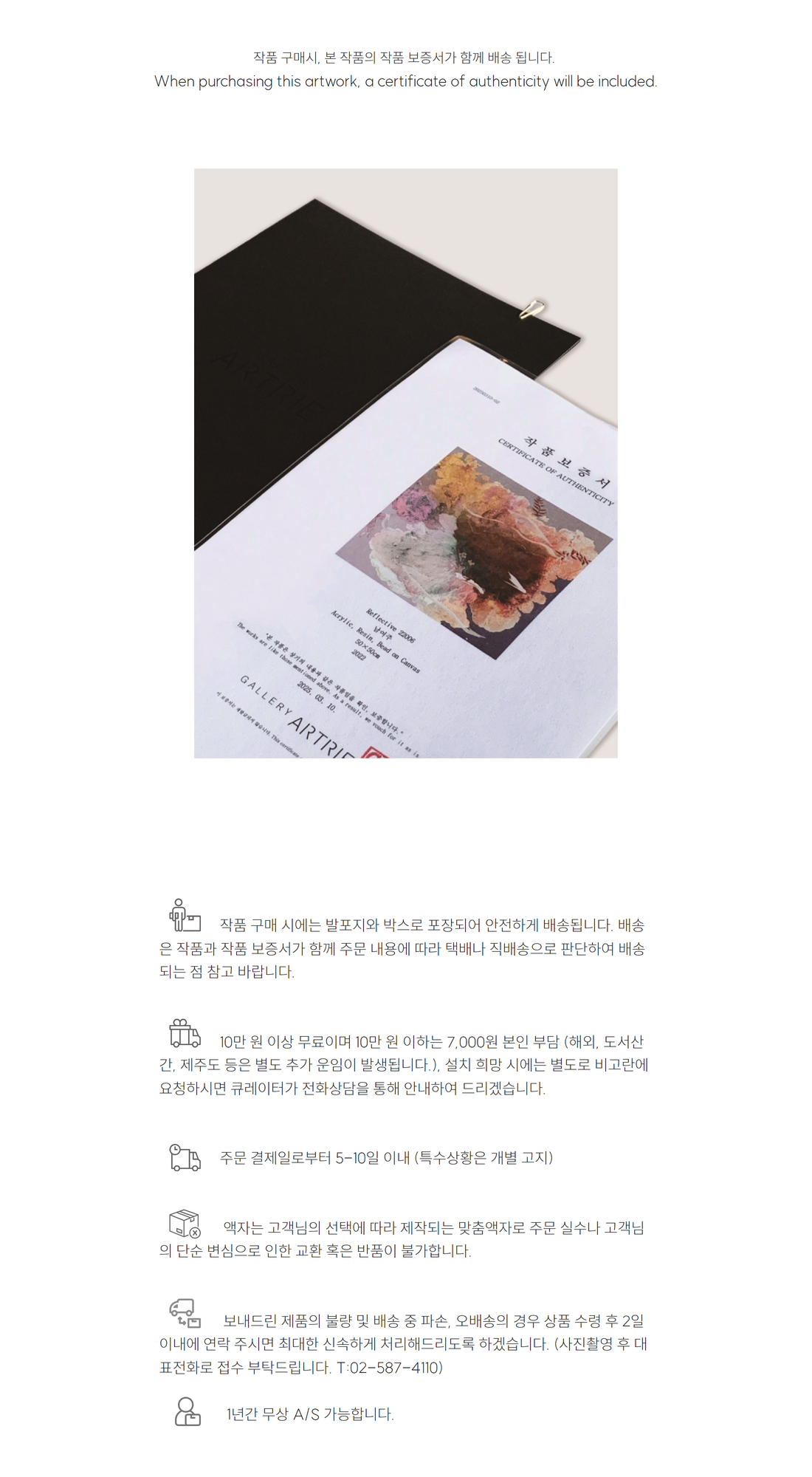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지만 “본능”은 그 명제의 기준에 벗어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 가치관의 기준, 그 모든 것 에서 해방되어있는 것이 바로 본능이다. 본능은 아주 기초적인 욕구에 뿌리를 두고 있다. 먹고 싶다. 자고 싶다. 쉬고 싶다. 살고 싶다. 혹은 죽고 싶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욕구 말이다. 프로이트는 말했다. 본능은 힘찬 말이고 자아는 마부라고. 하지만 본능을 제어하는 것이 자아일까? 자아가 그것을 억제하고 우리를 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일까? 맞다. 하지만 자아는 본능을 억제하진 못한다. 아니 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아의 역할이 아니다. 자아의 역할은 본능조차도 하나의 선택사항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데 있다. 예를 들어, 갓난아이는 졸음이 오면, 잠을 거부하지 않는다. 울음이 터진다? 그것 역시 거부하지 않는다. 그저 받아드리기만 한다. 본능에 no는 없다. 그렇다고 자아가 no를 외치는 것은 아니다. 자아는 본능에 no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졸음이 왔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졸음과 함께 서있는, 하지만 전혀 다른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
그것은 세포와도 같다. 복수(複數)의 개념이다. 그것은 인간의 육체적 부피에 비례하여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처럼 개체를 늘려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분열이나 복제에 의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탄생의 의미와 뜻을 같이 한다. 그 탄생의 힘은 경험, 혹은 지식의 습득에서 온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한 순간, 그 경험의 포괄적인 의미, 그 의미에서의 선택, 그 선택의 반응, 결과, 이런 것들이 새로운 그것을 탄생하게 한다. 그것의 필수 요소는 "메모리(기억)"이다. 그것은 선택을 하게 된 동기와 선택의 결과를 기억하고 있다. 선택에 선택을 거듭 할수록 개체를 늘여간다. 여기서 [그것]은 작가의 해석으로 표현되는 [자아]이다.